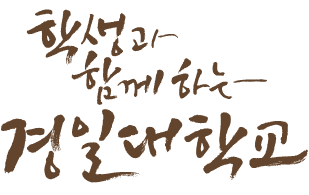제목매일- 신재기교수 '주말에세이'
- 작성자
- 이미경
- 작성일
- 2005/02/11
- 조회수
- 1096
매일신문 2005 02 12
주말 에세이-설, 고향, 연(鳶)
.을유년 닭의 해 설날이 코앞에 다가왔다. 징검다리 연휴여서 모처럼 일주일 동안 느긋한 설의 진미를 맛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설 대목인데도 예전과 같은 설렘이 없다.
.
고향 큰집엔 환갑을 넘긴 초로의 형님 내외가 살고 있고 그동안 명절과 조상 섬기는 대소사에는 흔쾌히 참석해 왔는데, 어쩐 일인지 올해는 설이 다가와도 마음이 고향으로 끌리지 않는다. 며칠 밤을 자야 설날이 되는지를 손꼽아 기다리던 그 예전의 동심은 아득하게 가물거릴 뿐이다. 고향을 찾아 일가 피붙이가 한자리에 모여 같은 피를 나눈 가족임을 확인하는 시간과 공간이 설이 아닌가.
.
그런데 고향은 언제나 이중성을 지닌다. 만남을 통해 타향살이의 설움을 삭이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다시 서로 헤어져야 할 슬픔을 감추고 있다. 어쩌면 정주할 수 없이 떠돌아다녀야 한다는 우리의 숙명적인 한계를 옹골차게 일깨워주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
이 만남과 헤어짐의 이중성 앞에 우리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의식 속에 떠올리는 순간 존재의 초라함을 확인하고 말기 때문이다. 무관한 체하는 것이 상처를 덜 받는다. 설은 오랫동안 고향의 은유였으나, 최근에 이르러 양자의 인접성은 점점 멀어지는 듯하다.
.
고향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자아 올리던 설, 고향의 기호로서 역할을 해오던 설은 이제 건조한 기표로서만 남아 있다. 설은 고향의 중심 이미지였으나, 그 이미지는 점점 빛을 잃어가더니 종국에는 과거의 환상 속에 묻혀 버린다. 우리는 단지 그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실제적인 공간으로서 고향은 있으나, 진정한 마음의 안식처로서 고향은 어디에도 없다는 생각을 해본다.
.
고향이란 공간이 마음속에서 빠져나간 뒷자리에 설은 그저 하나의 의식이고 관습이 만들어 낸 관념의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설은 유년 시절 추억의 동산이었을 것이다. 막연했지만 그때는 그 동산에서 내일을 꿈꿀 수 있었는데, 이제는 기진맥진하여 그 꿈이 가당치 않다.
.
고향을 떠나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이 연줄처럼 가물가물하다.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가는 실에 매달려 지나 온 날들이 바드럽기 그지없다. 산골 촌놈이 의기양양하게 도시에 입성하여 뭔가 쌓으려고 바동거렸던 그 세월은 고향에 대한 배반으로 채색되고 만 것 같다.
.
아니 오만함을 보고 고향이 나를 버렸는지 모를 일이다. 하지만, 고향으로 연결된 인연의 줄은 금방 끊어질 듯하지만 끊어지지 않는 질긴 운명의 줄이다. 설에 대한 나의 지난 추억은 언제나 연(鳶)에서부터 시작되었다.
.
오목한 골짜기 안에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산촌 마을. 서북쪽에서 골짜기를 타고 내려오는 차가운 산바람은 늘 나에게 다정한 귓속말을 건네곤 했다. 연을 날리기에 적당한 바람이었다.
.
논밭에는 가을에 심은 보리들이 힘겹게 한겨울을 넘기고 있었다. 나는 그 보리밭을 밟으면서 창공에 연을 날렸다. 영원한 자유를 꿈꾸었는지 모르겠다. 연이 창공을 비상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연줄이 필요하다. 만약 연줄이 끊기면 연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허공을 이리저리 떠돌다 결국은 추락하고 말 것이다.
.
절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인연을 끊어야 하지만, 한편으로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질긴 인연의 줄에 의지해야 한다. 그 줄을 잡고 작은 가슴을 태우는 일이 비록 구차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삶에 대한 사랑이라면 포기할 수 없으리라.
.
설을 맞이해 우리는 모두 고향에 간다. 열 시간이 걸려도, 밤을 새워서라도 고향에 간다. 고향이 사라지고 없더라도 그 흔적이라도 확인하고 와야 한다. 내 삶의 뿌리가 거기에 있고 마지막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아닌가. 고향 마을 어귀로 들어가는 길이 훤하게 펼쳐진다. 그 길 위에 또 길이 있다. 지금 나는 그 길을 걷고 있다.
.
신재기(문학평론가·경일대 미디어문학과 교수)
.
- 첨부파일
- 첨부파일없음
- 이전글
- 경북- 이해영교수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