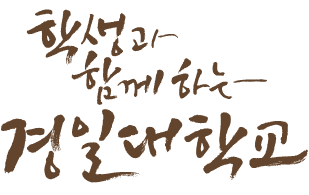제목매일- 김명철교수 '주말 에세이'
- 작성자
- 이미경
- 작성일
- 2004/12/07
- 조회수
- 1612
매일신문 2004 12 04
주말 에세이-교동시장
대구시가지 중심부인 중구 교동에 교동시장이 있다. 어릴 적 우리 집은 교동시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유난히도 몸이 약했던 내게 “너는 얼굴이 희어서 무슨 색깔의 옷이라도 잘 어울리는구나” 하며 명절 옷을 사주시던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간 곳이 거기였다.
.
형광등이라는 새로 나온 전등을 처음 산 곳도 그 곳이었다. 전파상의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갖가지 전기 제품들은 내게 끝없는 공상의 출발점이 되었고, 몇 군데 극장 광고판에 붙어 있는 10여장씩의 스틸 사진들은 영화를 보지 않고도 주인공들의 활약상을 마음껏 상상할 수 있는 충분한 재료가 되었다.
.
시장의 아이들은 모두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는 친한 친구들이기에 이 골목 저 골목에서 한 떼를 이루어 노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이었다. 양복지나 한복감을 파는 옷전을 지날 때면 지독한 포르말린 냄새로 인해 숨을 참고 뛰어보지만 매번 눈물을 흘려야 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웃고 있는 고운 한복 차림의 주인 아주머니들의 모습은 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다.
.
북서쪽 시장 어귀에 있는 양품점과 손수건 가게 앞에는 가방을 하나씩 부둥켜안은 아주머니들이 지나가는 사람을 유심히 쳐다보다 “달러 바꿀거냐”고 열심히 묻곤 했다. 비슷한 품목을 취급하는 가게가 줄지어 있는 곳은 으레 일인용 의자를 내어 놓고 가게 앞에 앉은 젊은 점원들의 호객행위에 행인들은 적잖은 고초를 겪으며 지나가야 했다.
.
밤이면 북적대는 거리를 밝히는 가게의 전등이나 리어카의 카바이드 불빛도 인파들로 인해 신이 나는 것 같았다. 시장 어느 곳을 가더라도 들을 수 있는 북한 말씨는 전쟁 피란민들의 생활력을 그대로 반영이라도 하듯 강해서 시장은 마치 살아서 천천히 움직이는 한 마리의 거대한 용과 같이 늘 꿈틀대고 있었다.
.
어릴 적 기억이 유난히 강해서인지 요즘도 가끔씩 일삼아 교동시장을 가보지만 예전의 그 힘을 느낄 수 없다. 최근에 형성된 귀금속 전문상가로 인한 활기가 시장에 있기는 하나 그 모습이 아직은 낯설기만 하다. 사람이 바뀌면 땅도 바뀌는가 보다.
.
이제는 사람이 대부분 살지 않아 을씨년스런 뒷골목으로 변해버린 상가주택들 앞에 서서 지금이라도 이름을 부르면 그 좁은 골목 양쪽에서 낯익은 얼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올 것만 같은데….
.
그 많은 아이들은 어디서 어떻게 자식들에게 그 시절을 이야기하고 있을지 궁금하기만 하다. 가끔씩 들르는 전자 제품점 중년의 아낙에게 부친의 근황도 물어보고 지난 세월에 대해 말도 꺼내어 보지만 대화 속에 끝내 녹지 않고 굴러다니는 앙금은 막연한 그리움이다.
.
낯선 것은 스쳐 지나가는 행인이나 상인들의 얼굴만이 아니다. 반 위협적인 호객꾼의 큰 목소리 대신, 단골이라며 사소한 물건 하나에도 사근사근 반갑게 맞아주는 젊은 주인들의 말투와 마음 씀씀이조차 어째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은 대상없는 시비인지 어설픈 감상인지 모르겠다.
.
사람들에게 과거라는 시간은 익숙하고 친숙한 것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화시키는 기능이 있어 추억을 넘어서는 연민과 집착이 있는 것 같다. 그러기에 일상의 반복으로 인해 무디어진 감각의 더듬이들을 헤치고 한 번씩 내면에 저장되었던 그 무엇이 망각의 담을 슬며시 넘어와 우리 가슴을 저리게 하는 때가 있다.
.
부끄러웠던 일과 힘든 순간들조차도 어느덧 거칠지도 않고 보듬고 싶은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남을 본다. 이제 12월이다. 교동시장 한 모퉁이에 오늘도 여느 모습 그대로 앉아 있는 서너 사람의 달러 환전상 할머니들. 그 일상적인 몸놀림을 바라보며 2004년의 지나간 시간들도 더욱 더 아름다운 것들로만 바뀌어 내 마음속에 남아 있기를 기대해 본다.
.
김명철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 첨부파일
- 첨부파일없음